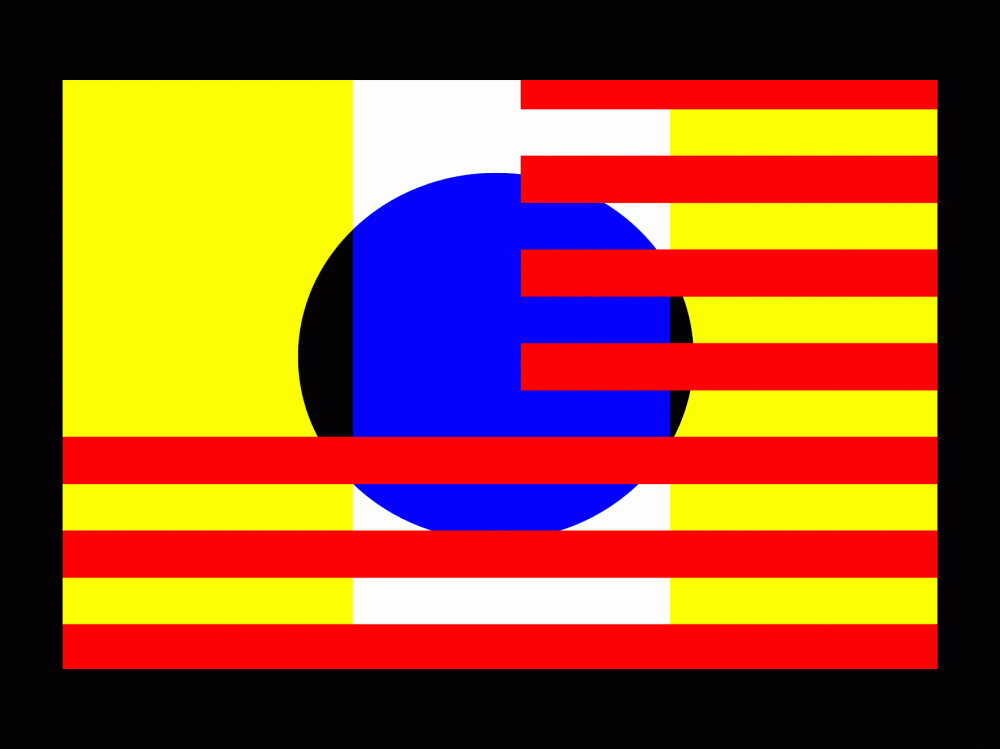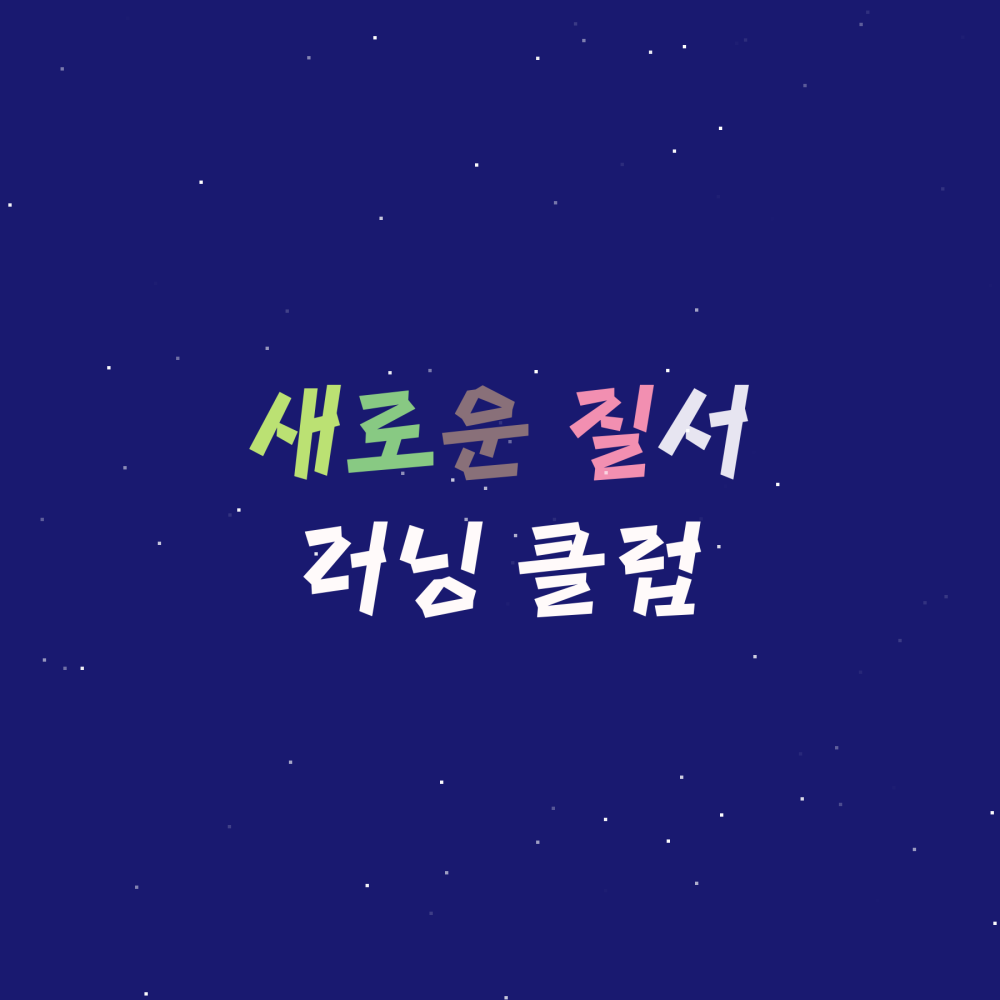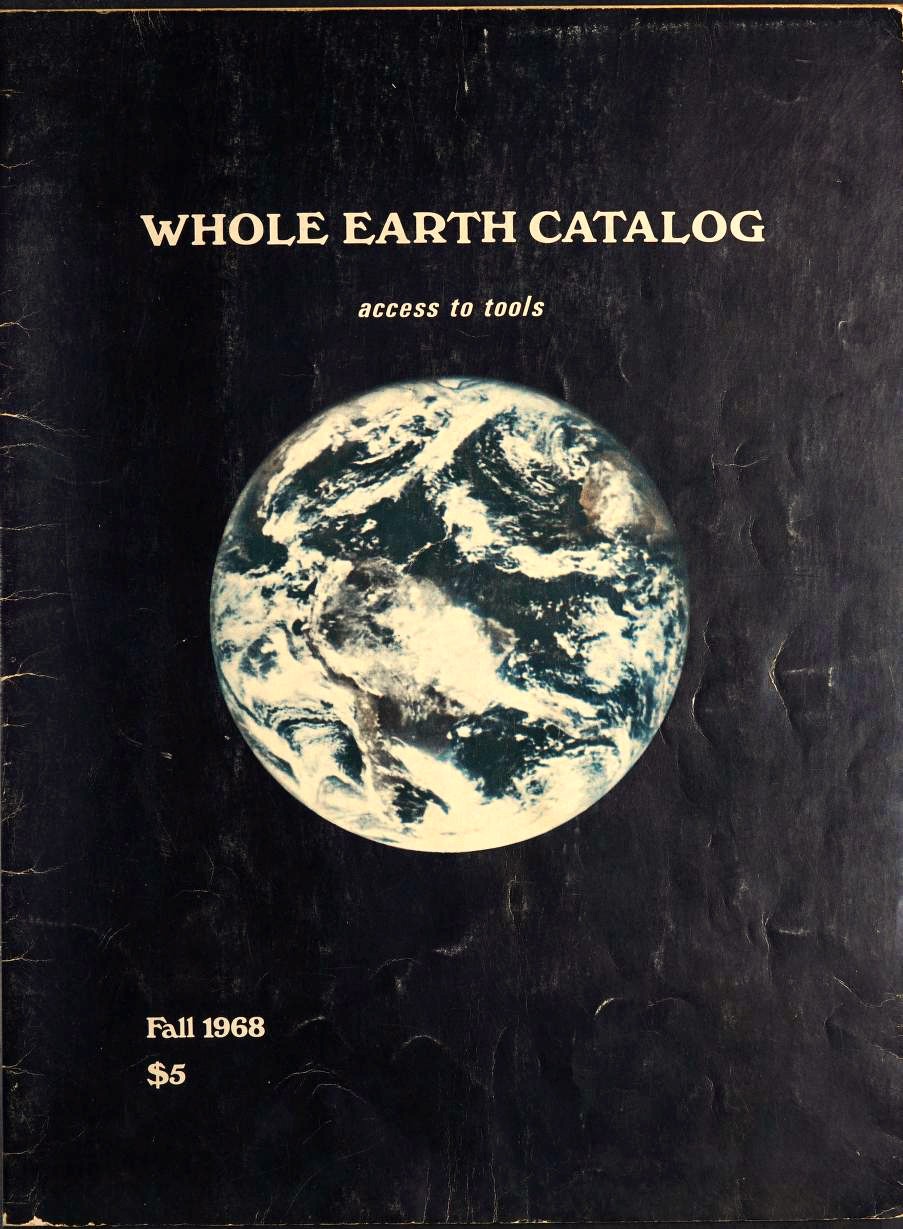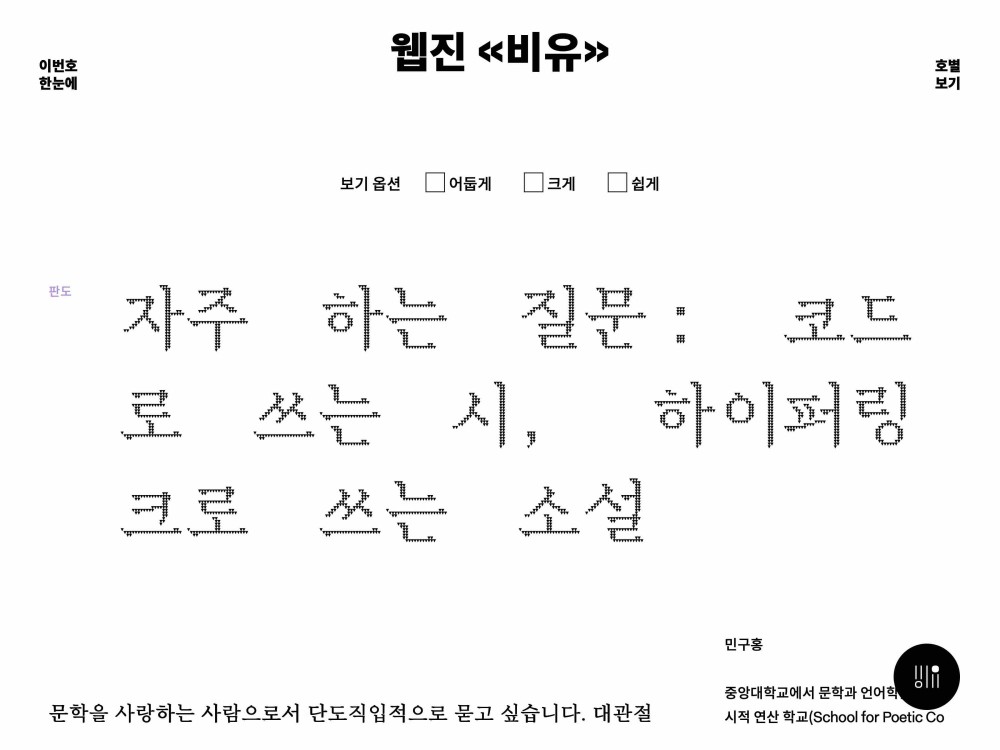처음

이 글은 『안상수: 안상수라는 창(窓)으로 만나는 디자인 세계의 만다라』(서울시립미술관·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2017)에 실린 「처음」을 일부 편집한 결과물로, 안상수 선생과 처음 만난 일화를 다룬다.
내가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구글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문청(文靑), 즉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내가 문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저 별다른 도구 없이 오직 글자만으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더없이 실용적이고, 나아가 아름답게 느껴진 까닭이다. 하루는 과제를 위해 아래아 한글로 베껴 써 출력한 단행본 한 구절이 실제 지면과 유달라 보였다. 글자체나 글자 크기는 서로 같아 보였지만, 까닭 모르게 단행본 쪽이 훨씬 그럴듯하게 보였다. 이상했다. 자연스럽게 그 이상함을 따라가다 보니 낱자, 글자, 단어, 구절, 문장, 문단, 나아가 글을 둘러싼 공간을 제어해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을 ‘타이포그래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타이포그래퍼’로 일컫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타이포그래피는 그때껏 주로 배운 문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글자를 다루는 점에서, 게다가 까닭 모를 아픔과 고독을 즐기며 예술가연하는 학교 분위기가 낯익은 내게 목적이 뚜렷한 실용 기술에 가까워 보이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타이포그래피를 알아두면 나중에 제법 쓸모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라는 여섯 음절이 까닭 없이 제법 우아하게 들렸다.
어딘가 기록해뒀더라면 좋았겠지만, 구글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한글’과 ‘타이포그래피’, 또는 그 반대 아니었을까. 무수한 결과물 가운데 선생의 이름이 가장 많이 눈에 띈 점만큼은 뚜렷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구글의 검색 결과를 맹신하던 내게 이는 곧 선생이 한국에서 손꼽히는 타이포그래피 전문가임을 뜻했다. 그렇게 발견한 선생의 웹사이트를 통해 선생이 『보고서\보고서』 1호를 펴낸 1988년부터 습관처럼 찍어온 ‘원 아이’를 알게 된 때도 그 무렵이다. 그저 타이포그래피와 관련한 책을 추천받을 셈으로 다짜고짜 선생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 주소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ssahn@chol.com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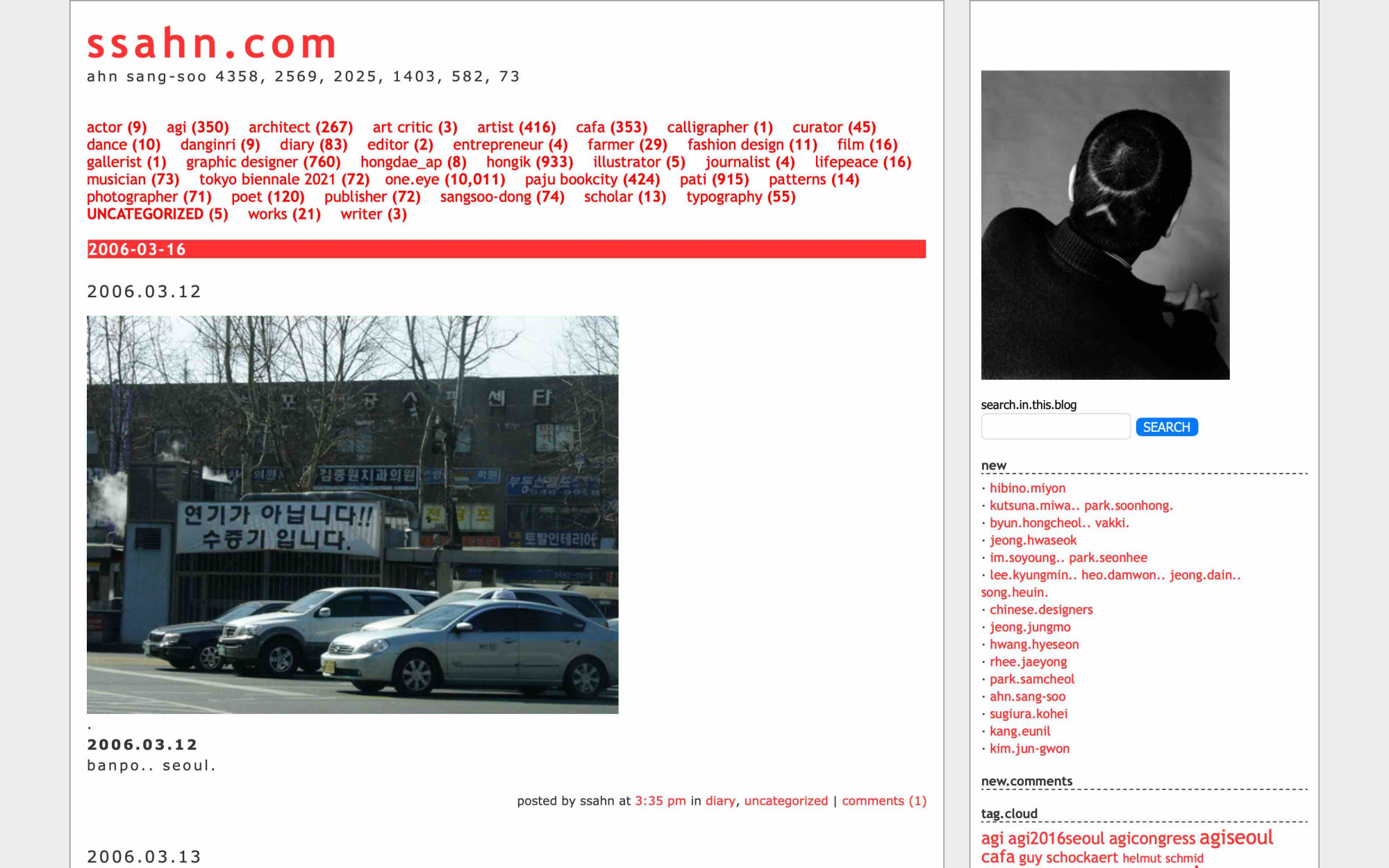
약 5분 뒤 답장이 왔다. 띄어쓰기해야 할 곳에는 마침표(.)가 하나, 마침표를 찍어야 할 곳에는 마침표가 둘 찍힌 채였다. 그 뒤 선생 자판에서 스페이스 바가 고장 난 줄로 오해하며 (선생이 띄어쓰기 대신 마침표를 찍는 사실을 안 것은 훨씬 뒤였고, 선생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단어 사이마다 찍힌 마침표가 선생의 글을 신중히 읽게 했다.) 30여 분 동안 문자 메시지처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마침표가 오가는 대화 끝에 선생이 권한 책은 에밀 루더(Emil Ruder)가 쓴 『타이포그래피』(Typographie)였다. 2001년 2월 28일 안병학 선생이 디자인하고, 안그라픽스에서 펴낸 한국어판이었다. 선생이 옮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은 스위스인 타이포그래퍼 겸 그래픽 디자이너가 쓴 문장은 여러 번 곱씹어 읽어야 뜻을 헤아림 직했고, 그저 근사해 보이는 흑백 도판에는 목적과 달리 어딘지 비밀스러운 데가 있었다. 책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수록 막연히 타이포그래피에 통달한 선생에게 비전(祕典)을 물려받은 듯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7년 3월, 입대를 두어 달 앞두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문학에 있었다. 정도나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구체시나 울리포(Oulipo) 운동, 누보로망(Nouveau Roman) 등은 작가가 내용만큼이나, 또는 내용보다 형식을, 다시 말해 타이포그래피를 의식한 결과였다. 타이포그래피는 오이겐 곰링어(Eugen Gomringer)가 쓴 (또는 레이아웃한) 「침묵」(Silencio)에서는 그 자체로 침묵을 드러내는 작품이 됐고, 조르주 페렉(Georges Perec)이 쓴 『실종』(La Disparition)이나 알랭 로브그리예(Alain Robbe-Grillet)가 쓴 『질투』(La Jalousie)에서는 작품을 이루는 형식에 침범하거나 스몄다. 지금은 거의 잊힌 과거나 형식이 두드러진 작품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타이포그래피는 작가가, 특히 시인이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었다. 같은 문장을 다루더라도 어디서 끊어 다음 줄이나 연으로 보낼지, 어디에 마침표나 쉼표를 넣을지, 특정 단어나 구절을 얼마나 반복할지 등에 따라 작가가 전하려는 바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입대한 뒤로 선생과 연락할 일이나 길은 없었다. 단, 선생이 권한 책은 내 자리에 놓였고, 상부에 올릴 보고서를 쓰거나 크고 작은 행사 현수막을 만드는 데 제법 쓸모가 있었다. 강조해야 할 곳은 크거나 색을 넣어, 나머지는 작거나 색을 빼 보인 일이 고작이었지만 군대에서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로부터 2년여 뒤 홍익대학교 대학원 활판 워크숍에서 선생과 처음 만났다.
파주출판도시.활판.공방에서..
만나면.어떨까?.
일종의 전역 신고로 선생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이었다. 선생이 보낸 메일은 반갑게도 여전히 띄어쓰기할 곳에 마침표가 찍힌 채였다. 낯선 활판 공방에 들어서서 대학원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쭈뼛거리며 인사한 내게 선생은 그저 긴 팔을 들어 내가 앉을 자리를 가리켰다. 사흘에 걸친 워크숍에서 기억에 남은 점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명함 몇 장과 시 몇 편을 활자로 조판해본 일보다 선생 셔츠 주머니에 꽂힌 구레타케(呉竹) 붓펜과 ‘일수 수첩’으로 불리는 작은 수첩이었다.
그 뒤 나는 선생 연구실에서 1년 가까이 일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본 것은 선생이 언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군데군데 먹물이 번진 셔츠 주머니에서 붓 펜과 수첩을 꺼내는 모습이었다. 누군가와 마주할 적에도 마찬가지였다. 선생은 적었다. 한 일과 할 일을 적고, 그 가운데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적었다. 언젠가 만들 포스터와 엽서에 넣을 문구를 적었다. 상대방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고, 빵집 이름을 적었다. 붓펜의 먹물이 떨어지면 연필로, 수첩에 빈 장이 없으면 대충 휴지를 뽑아 적었다. 선생은 고치기도 했다. 적고나서 고치고, 적으면서 고쳤다. 다 쓴 수첩은 연구실에 있는 책장에 켜켜이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았다. 타이포그래피 같은 건 나중 일이었다.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에버노트, 폭스프로(FoxPro) 등으로 선생이 활용하는 도구는 다양하고 편리해졌지만, 어쨌든 선생이 임하는 일은 모두 적는 일에서 시작하는 듯했다. 그래서 선생은 지금껏 내게 타이포그래퍼나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적는 사람’으로 남았다. 타이포그래피에 관해 내가 선생에게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글자체를 어떤 크기와 글줄 사이로 쓸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용을 비롯해 내용을 만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일 테다. 그런 점에서 이 기회에 선생에게 처음 보낸 메일 마지막에 다음 문장을 덧붙이고 싶다.
그런데 그 방에 누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 일은 무엇이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저 처음이라는 점에서 기억할 만하다. 모든 일은 무엇이든 이전과 조금이나마 다르다는 점에서 늘 처음 한 일이고, 그런 점에서 기억할 만하지 않은 일은 없다. 선생의 연구실인 ‘날개집’에 막내로 들어가 작게는 편지 봉투에 편지지를 바르게 넣는 법을 배운 일, 카메라를 든 선생 앞에서는 한 눈을 가려야 한다는 일에서 크게는 2013년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개교 준비를 돕고 거기서 가르친 일, 안그라픽스로 자리를 옮겨 ‘16시’1를 기획한 일까지, 선생과 지금껏 처음 한 일 가운데 편한 대로 몇 가지 ‘처음’에 관해 쓴 까닭이다. 처음이다.
-
‘16시’는 시인과 타이포그래퍼가 만드는 작품집이다. 16시는 제한된 16쪽의 평면을 시인과 타이포그래퍼에게 제공하고, 그들은 이 공간을 채운다. 채움의 형식은 협업이 될 수도, 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온전히 작업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작업이 작업자들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시와 타이포그래피가 한 몸이었던 적이 있었다. 16시는 과거를 굳이 발판 삼지 않고, 시간이 흐르며 나뉜 둘을 다시 합쳐보는 작은 놀이이자 실험이다. 16시의 놀이와 실험은 어떤 시곗바늘도 16을 가리키지 않는 세계에서 펼쳐진다. ↩